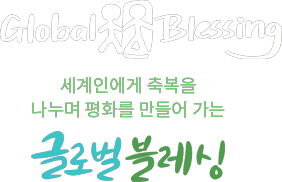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페이지 정보
하재린운 0 Comments 5 Views 25-11-12 07:23본문
[EPA = 연합뉴스]
일본에서 ‘서브웨이’와 ‘TGI 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외식업을 하는 와타미는 지난달 정년을 65세로 올렸다. 이와 함께 75세까지 재고용 형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인력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도 주기 위한 정책이다.
고령자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25년 전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 왔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몇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식에서도 정부는 기업에 무려 12년의 시간을다스텍 주식
줬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986년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고, 1998년에야 정식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정년 65세 연장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200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정비해 기업에 65세 이상 고용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이후 2006년부터 기업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 ‘정쌍용차주가
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당장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를 등을 할 경우 임금 부담이 커진다. 대신 계속고용을 하게 되면 만 60세에 고용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 이 경우 급여를 대폭 줄이는 등 고용 유지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8추세매매
5.8%의 기업이 계속고용을 선택했다. 또 초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기업이 하도록 했다. 당시는 일본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할 때였다. 실적이 떨어지는 시니어 사원을 고용하면서까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외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2013년에는 노사 협의로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4월부터는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투자자문
마무리했다.
현재 전체 기업의 99.9%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실상 만 65세로 정년을 늘려놓은 상황이다.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한 기업도 40%에 달한다.
최근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증시시황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가 930만명으로, 21년 연속 증가했다. 일하는 사람 7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취업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13.7%에 달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이나 철도회사인 JR동일본 등은 내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계획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70세 고용이 정착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고령자의 업무 노하우와 기술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의 두 번째 원칙은 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과 2000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올렸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20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3년마다 1세씩 올렸다. 201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후생연금도 2013년 4월부터 지급 개시 연령이 61세로 조정됐으며 남성의 경우 2025년부터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수급 전에 퇴직을 함으로써 소득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연장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속고용 제도를 선택지에 뒀다. 계속고용은 정년으로 한 번 퇴직 처리를 한 뒤 다시 고용을 연장하는 형태다.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상석연구원은 “재고용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임금의 50~70% 정도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는다”며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을 이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서브웨이’와 ‘TGI 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외식업을 하는 와타미는 지난달 정년을 65세로 올렸다. 이와 함께 75세까지 재고용 형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인력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도 주기 위한 정책이다.
고령자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25년 전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 왔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몇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식에서도 정부는 기업에 무려 12년의 시간을다스텍 주식
줬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986년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고, 1998년에야 정식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정년 65세 연장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200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정비해 기업에 65세 이상 고용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이후 2006년부터 기업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 ‘정쌍용차주가
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당장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를 등을 할 경우 임금 부담이 커진다. 대신 계속고용을 하게 되면 만 60세에 고용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 이 경우 급여를 대폭 줄이는 등 고용 유지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8추세매매
5.8%의 기업이 계속고용을 선택했다. 또 초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기업이 하도록 했다. 당시는 일본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할 때였다. 실적이 떨어지는 시니어 사원을 고용하면서까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외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2013년에는 노사 협의로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4월부터는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투자자문
마무리했다.
현재 전체 기업의 99.9%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실상 만 65세로 정년을 늘려놓은 상황이다.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한 기업도 40%에 달한다.
최근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증시시황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가 930만명으로, 21년 연속 증가했다. 일하는 사람 7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취업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13.7%에 달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이나 철도회사인 JR동일본 등은 내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계획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70세 고용이 정착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고령자의 업무 노하우와 기술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의 두 번째 원칙은 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과 2000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올렸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20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3년마다 1세씩 올렸다. 201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후생연금도 2013년 4월부터 지급 개시 연령이 61세로 조정됐으며 남성의 경우 2025년부터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수급 전에 퇴직을 함으로써 소득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연장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속고용 제도를 선택지에 뒀다. 계속고용은 정년으로 한 번 퇴직 처리를 한 뒤 다시 고용을 연장하는 형태다.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상석연구원은 “재고용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임금의 50~70% 정도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는다”며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을 이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